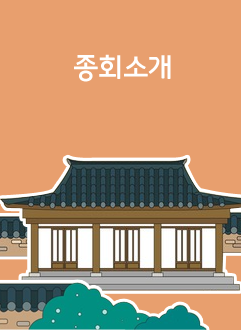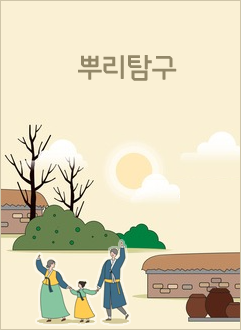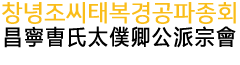한성판관 조실구 묘갈명: 고산 윤선도 지음
페이지 정보
孤竹先生 작성일24-07-01 09:01 조회19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영남 제일 부자인 군위현감-한성판관 조실구(曺實久, 1591~1658)는 1728년(영조4) 무신혁명(이인좌의 난) 조세추(曺世樞)의 증조부이며, 무신혁명 대원수인 이인좌(李麟佐, 1695~1728)의 외증조이기도 하다.
조실구 첫째 아내는 병조판서 유희분(柳希奮, 광해 처남)의 딸이다. 문화유씨 묘소는 성남시 서현동 산32 안골(893m²) 조몽정(조실구 증조부) 묘소 내에 있다.
1623년(인조1) 3월 계해정변(인조반정) 후 조실구가 온전한 것은 매제인 경창군 이주 도움과 1624년 1월 이괄(李适)의 변란 때 호종(扈從)한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위현감(종6품)-한성판관(종5품) 조실구 묘소(온양정씨와 합분)는 문경읍 갈평리에 있다. 둘째 아내 온양정씨(溫陽鄭氏, 1606~1681)의 아버지는 정환(鄭晥, 1585~1609)이며, 그의 아들 정뇌경(鄭雷卿, 1608~1639, 필선)은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수행했는데 청나라가 처형했다. 정환(鄭晥) 손아래 동서는 용인현감 남식(南烒, 1689~1650, 남구만 조부)과 사계 김장생(沙溪金長生, 1548~1631) 아들인 이조참판 김반(金槃, 1580~1640)이다. 남식 사위는 심양에서 처형당한 삼학사(三學士) 오달제(吳疸濟, 1609∼1637)다. 조실구 매제는 경창군 이주(인조 삼촌)다. 김장생은 예설(禮說)을 집대성한 예서(禮書)인 가례집람(家禮輯覽)을 1599년(선조32) 편찬한 인물이다.
조실구 처남이 필선 정뇌경이고, 정뇌경 아들은 우참찬 정유악(鄭維岳, 1632~1702)이며, 정유악은 1694년(숙종20) 갑술환국 때 서인들에 의해 진도로 유배됐다. 정유악 차남은 1728년 무신혁명 때 전라감사 정사효(鄭思孝, 1665~1730)인데, 정사효는 무신혁명 박필몽 사촌 처남으로, 무신혁명에 연루돼 장살됐다.
경상도 제일 부자인 조실구 묘갈명은 1666년(현종7) 7월, 전 공조참의 윤선도가 짓고, 성호 이익 아버지인 출신(出身) 이하진이 서전(書篆)했다.
묘소 비석은 1728년 무신봉기(이인좌의 난) 후 파괴됐다. 묘소는 옛 문경군 신북면 지역이었던 문경읍 갈평리 산 18번지에 있다. 조실구는 이천부사 조명욱 아들이다. 풍수에 심취했고, 조부모(참판 조탁-죽산박씨) 및 부모(부사 조명욱-원주원씨) 묘소를 길지(吉地)에 안장하려고 애를 쓴 효자이기도 했다.
*이 블로그 '조실구 선영도 기(記)와 정두경, 묵사동 고택과 조세추!' 참조: https://blog.naver.com/antlsguraud/221364176123
□ 통훈대부 행 한성부 판관 조공 묘갈명 병서(通訓大夫行漢城府判官曺公墓碣銘 幷序): 1666년(현종7) 7월 전 공조참의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 1587~1671, 좌승지)가 유배지 전라도 광양에서 지음. 출신(出身) 매산 이하진(梅山 李夏鎭, 대사헌)이 서전(書篆)함.
둘째 부인 온양정씨(溫陽鄭氏, 1606.2.16~1681)가 1666년 2월 환갑을 지내고 남편 조실구 묘갈명을 고산(孤山)에게 의뢰하여 7월에 지음. 온양정씨 동생인 정뇌경(鄭雷卿, 1608~1639, 필선)의 묘갈명을 앞서 1661년(현종2) 고산(孤山)이 유배지 함경도 삼수(三水)에서 찬(撰)한 것이 영향을 줬음.
공의 성(姓)은 조(曺)이다. 휘(諱)는 실구(實久)요 자(字)는 자성(子誠)이니, 창녕(昌寧)의 세가(世家)이다.
시조(始祖) 휘(諱) 겸(謙)은 고려조(高麗朝)에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어 관직이 태악승(太樂丞)에 이르렀다. 고조(高祖) 휘 언박(彥博)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호조 좌랑(戶曹佐郞)으로 부제학(副提學)에 추증(追贈)되었다. 증조(曾祖) 휘 몽정(夢禎)은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되었다. 조부 휘 탁(倬)은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문장에 능하여 장원급제하였으며, 화려한 관직을 차례로 역임한 뒤에, 만년에는 겸퇴(謙退)하여 조용히 지내면서 서사(書史)를 혼자 즐겼는데, 그가 저술한 《이양편(二養編)》 3권이 세상에 유행한다.
부친 휘 명욱(明勖)은 문과에 급제하여 품계가 통정대부(通政大夫)였으며 이천 부사(利川府使)로 좌의정(左議政)에 추증되었다. 모친 원주 원씨(原州元氏, 주: 평택 도일동 거주)는 (경상좌)병사(兵使) 준량(俊良)의 손녀요, (적성)현감(縣監) 연(埏, 주: 삼도수군통제사 원균 동생)의 딸이다. 공은 만력(萬曆) 신묘년(1591, 선조24) 8월 13일에 태어났다. 을묘년(1615, 광해군7)의 진사시(進士試)에 입격(入格)하였으며, 누차 문과(文科)에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하였다. 관직은 군위 현감(軍威縣監) 한성부 판관(漢城府判官)에 이르렀으며, 무술년(1658, 효종9) 7월 4일에 생을 마치니, 향년 68세였다.
처음에 문화 유씨(文化柳氏) 희분(希奮, 주: 병조판서)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두 번째로 온양 정씨(溫陽鄭氏) 생원(生員) 휘(諱) 환(晥, 주: 아들은 심양에서 소현세자를 모시다 처형된 필선 정뇌경)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모두 자녀를 두지 못해서, 족제(族弟)인 (합천 묘산 출생인) 좌랑(佐郞) 시일(時逸, 주: 1728년 무신혁명 조정좌 증조부, 조성좌 종증조부)의 아들(주: 삼남) 하장(夏長, 주: 장인은 1623년 3월 계해정변 후 관작삭탈된 백천현감 남두춘, 처조부 병조참판 남이신)을 후사로 삼았다.
공이 진사에 뽑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궁(東宮)의 세마(洗馬)에 보임되고 부솔(副率)로 옮겼다가 곧바로 관직을 그만두었다. 이는 대개 계축년(1613, 광해군5) 이후로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서 관학(館學)이 어수선했기 때문이니, 그가 벼슬한 것은 단지 관학을 피하고자 해서였다.
중년에 떠돌다가 경상도 안동(安東)의 풍산(豐山)이라는 곳(주: 풍천면 가곡리 590-2번지)에 우거(寓居)한 20여 년 동안, 교유(交遊)를 끊어 버리고 벼슬할 뜻이 없었으니, 만년에 전성(專城: 현감, 군위현감)에 임명되고 부료(府僚: 판관, 한성판관)를 맡은 것도 공이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다.
참판공(參判公, 주: 조탁)의 장지(葬地)에 바위가 박힌 근심이 있었으므로 (아버지) 부사공(府使公, 주: 조명욱)이 생존했을 때부터 이장을 하려고 수십 년 동안 경영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그런데 공이 안동의 우소(寓所, 주: 풍천면 가곡리 590-2번지)에서 10리쯤(주: 실제로는 10km) 떨어진 곳의 종산(宗山, 주: 학가산) 아래 만운동(萬雲洞, 주: 풍산읍 만운리 )에서 길지(吉地, 주: 만운못 위 종미골 산 118-6번지)를 구해 얻어, 참판공(주: 조탁)의 묘를 이조(移厝)하고 그 남쪽 편의 언덕에 부사공(주: 조명욱)을 장례 지낸 뒤에 비석을 세워서 표시하였다. 그리고 공이 죽은 해 9월에 (양아들) 하장(夏長, 주: 1634~1661.1)이 공의 영구(靈柩)를 받들어 안동 선영(先塋)의 아래에 장례 지냈으니, 이는 공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하장은 어린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공이 죽은 지 3년 만에 하장이 죽고 그 아들마저 잇따라 죽고 말았다. 이에 (둘째 부인) 정씨(鄭氏, 주: 1606~1681)가 다시 공의 족제(族弟)인 (상주 매호 출생인) 사인(士人) 시중(時重, 주: 1612~1665, 조몽상<몽정 형> 증손)의 아들 하주(夏疇,주: 1650~1725)를 공의 후사(後嗣)로 삼았다.
아, 나는 공과 늦게 사귀었지만 공을 자세히 알고, 공을 드물게 만났지만 공을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다. 혼조(昏朝 광해군) 때에 이이첨(李爾瞻)이 광창부원군(廣昌府院君)이고, 유희분(柳希奮)이 문창부원군(文昌府院君)이고, 박승종(朴承宗)이 밀창부원군(密昌府院君)이었다. 당시에 이이첨이 국권(國權)을 쥐고 전횡(專橫)을 해서, 유희분과 박승종의 권세가 이이첨과는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다음 자리는 차지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들을 삼창(三昌)이라고 불렀다.
그리하여 삼창의 자제(子弟)와 친척들 치고 과거에 좋은 성적으로 급제하여 높은 관작을 차지하지 않은 자가 없었는데, 공은 유희분의 사위로서 끝내 과거를 통과하지 못했고 벼슬길에도 진출하지 못하였으니, 공의 사람됨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 자사자(子思子, 주: 공자 손자)는 작위(爵位)와 봉록(俸祿)을 사양하는 어려움을, 흰 칼날을 밟고 죽는 것과 나란히 열거하였다. 옛날에도 그러하였는데, 하물며 말세의 길에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과거 급제와 작록(爵祿)이 있는 것만 알 뿐, 인의(仁義)가 있는 줄은 더 이상 알지 못해서, 명리(名利)의 소굴 속으로 치달리며 날아가지 않는 자가 없다. 그리하여 아비는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형은 아우를 그렇게 권면하며 붕우는 서로 부르면서, 자기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을 생각하며 위험을 무릅쓰고 요행을 바라는 자들이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다. 자기 힘으로도 가능하고 형세상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하지 않았던 자를 찾아본다면, 우리 공을 제외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있겠는가. 가슴속에 터득한 것이 있지 않다면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공에게 취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 첫 번째의 일이다.
자사자(子思子)가 말하기를 “군자의 도는 제일 먼저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된다.〔君子之道 造端乎夫婦〕”라고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나의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까지 그 덕이 미쳐서, 집과 나라를 잘 다스린다.〔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라고 하였으며, 《대학(大學)》의 도(道) 역시 제가(齊家)를 치국(治國)의 근본으로 삼았으니, 사람이 남을 관찰할 때에도 이를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시인(詩人)이 문왕(文王)의 덕을 드러내려 할 때에는 문왕의 덕을 말하지 않고 단지 문왕의 후비(后妃)의 덕만을 말하였으며, 남국(南國)의 제후(諸侯)가 문왕의 교화를 입은 것을 드러내려 할 때에도 제후의 덕을 말하지 않고 단지 부인(夫人)의 덕만을 말하였으니, 옛사람의 견식(見識)이 이와 같았다.
내가 듣건대, 공의 (둘째) 부인 정씨(鄭氏)는 시부모를 모심에 순종하며 유순하였고, 지아비를 섬김에 부드러우면서 정직하였고, 부가(夫家)의 서제(庶弟)와 서수(庶嫂)를 대함에 예의 바르며 성의가 있었고, 가내(家內)의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식(衣食)을 각기 적절하게 제공하였으며, 가정(家政)의 사소한 일로 감히 공을 귀찮게 하지 않으면서도 공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있지 않았다고 하니, 부덕(婦德)이 융성했다고 말할 만도 한데 처도(妻道)를 이룸이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공에게 근본을 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공에게 취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그 두 번째의 일이다.
이 두 가지 일을 미루어 보면 백 가지 행실을 알 수가 있으니, 다른 것이야 기록할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진사(進士) 정유악(鄭維岳, 주: 정유악 고모부가 조실구이고, 심양에서 처형된 필선 정뇌경 아들임, 그후 우참찬 역임)이 그(주: 조실구)의 행장(行狀)을 지었음에랴. 정유악은 학자(學者)이니, 필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첨하며 구차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또 번거롭게 반복해서 논급(論及)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공이 알아줌을 받지 못한 것은 / 公不見知
대개 공이 자신을 지켰기 때문 / 蓋公自守
공이 쓰임을 받지 못한 것이 / 公不見用
어찌 공이 불우해서였겠는가 / 豈公不偶
자식을 두지 못한 것은 운명이요 / 命也無息
장수하지 못한 것은 운수일 따름 / 數也不壽
좋은 방향으로 닮도록 한 것은 / 式穀有似
하늘이 공을 저버리지 않음이니 / 天不公負
그대를 계승하지 않음이 없게 하여 / 無不或承
하늘이 앞길 열어 주고 도와주리라 / 天所啓佑
*이 블로그 '한성판관 조실구-온양정씨 표지석을 세우다.' 참조: https://m.blog.naver.com/antlsguraud/222288816789

"갈정승(葛政丞)이 이곳에 정착한 뒤 살았다"고 하여 '갈평(葛坪)'이라 불렀다고 한다. 소갈산(小葛山) 안쪽 산 4부 능선에 한성판관 조실구의 큰 무덤이 있다.
동네 사람들(이규철, 이상구 등)은 '왕묘, 왕능가(王陵家), 정승묘, 역적묘'라고 부르고 있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역적이 됐다"는 구전이 회자되고 있었다. 그런데 '갈정승(葛政丞)'이 한성판관을 지낸 효자(孝子) '조실구'가 아닐까.

▲10m 밑에서 촬영했다. 무덤이 조금 보인다. 묘좌 경파지원용혈(卯坐 庚破之原龍穴)에 있다.

▲조실구(曺實久, 1591~1658)-온양정씨(溫陽鄭氏, 1606~1681) 묘소(합분)다. 무신혁명이 발발하고 16년 뒤 1744년(영조20) 영조의 명(命)에 따라, 조몽정(曺夢禎)→조탁(曺倬)→이천부사 조명욱(曺明勗)→한성판관 조실구(曺實久)→조하장(曺夏長)·하주(夏疇)의 봉사손으로 조하장(曺夏長) 5촌조카 조명우(曺命佑, 1694~1758)를 입적시켰다. 조명우는 조하규(曺夏規, 1667~1709, 조실구 동생인 조실원 차남)의 아들이다. 조하규 처조부는 진사 한상길(韓尙吉)이고 처증조는 응교 한옥(韓玉)인데 두 사람 모두 폐모에 앞장선 북인 핵심 인물이다. 조탁, 조명욱, 조실구 후손인 조경강 및 조세추 들이 무신혁명 때 대거 핵심 인물로 가담하여 몰락했기 때문이다.
조명우 입적은 조몽정 둘째 아들인 형조정랑 조척(曺倜, 조탁 동생, 파주시 교하읍에 후손들 세거)의 증손인 조하격(曺夏格, 1693년생)과 조탁(曺倬) 사위 유윤창(柳允昌, 1583~1647, 마진군수)-창녕조씨(昌寧曺氏, 1583~1636.4)의 현손인 노론 대신 유복명(柳復明, 1685~1760, 교하 출생, 동지중추부사·형조판서)과 조명욱(曺明勗) 사위인 경창군(慶昌君) 6세손 이게(李垍, 1707~1757, 정언·동부승지, 이황 손자), 그리고 조명욱 외증손자인 유학 정진주(鄭鎭周, 1676~?, 이천 출생)가 영조에게 상언(上言)하여 성사된 것이다. 특히 정진주 조부인 정지숙(鄭之叔) 사위가 강릉부사 조기석(趙祺錫)인데, 조기석 외조부가 창원부사 도계 조정생(무신혁명조석좌·정좌 고조)이다.
하지만 조등, 조탁, 조명욱, 조실구, 조하주 등의 묘소는 돌보지 않아 석물은 죄다 뽑히고 비석은 없어졌다. 특히 조탁, 조명욱, 조실구 묘소는 버려졌다. 조명우(曺命佑, 아들: 曺允升·允斗) 현손(玄孫)대에 절손됐기 때문이다. 유윤창 조부는 함경도감사 유영립(柳永立, 1537~1599)인데, 그의 6촌동생이 영의정 유영경이며, 외손자가 영의정 최명길이다.

조실구 묘갈명은 1666년(현종7) 7월 전(前) 공조참의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가 짓고, 성호 이익(星湖 李瀷) 아버지인 이조참판 매산 이하진(梅山 李夏鎭)이 서전(書篆)했다. 하지만 1728년(영조4) 3월 무신혁명 실패 후 묘비, 상석, 망주석 등은 모두 멸실됐고, 조실구 손자 조경사, 증손자 조세추 등등은 처형됐다. 묘소는 200년 동안 황폐화됐다. 무신혁명이 발발하고 16년 뒤 1744년(영조20) 영조의 명(命)에 따라, 봉사손으로 조명우(曺命佑, 1694∼1758)를 입적시켰다. 하지만 조명우(曺命佑, 아들: 曺允升·允斗) 현손(玄孫)대에 절손(絶孫)돼, 조등, 조탁, 조명욱, 조실구, 조하주 등의 묘소는 돌보지 않아 석물은 죄다 뽑히고 비석은 없어졌다. 특히 조탁, 조명욱, 조실구 묘소는 버려졌다.

▲영남 제일 부자인 군위현감-한성판관 조실구-온양정씨 묘소 뒤에서 촬영했다.

▲한성판관 조실구(曺實久, 1591~1658)-온양정씨(溫陽鄭氏, 1606~1681, 필선 정뇌경 누나) 묘소(합분) 뒤에서 촬영했다. 투장 흔적이다. 인근 관음2리 양씨(梁氏)가 투장했다가 변고가 생겨 이장해 갔다고 한다(갈산마을 이규철 증언).하지만 묘소 뒤쪽 5m에 묻어놓은 상석에서는 '처사 전주 이춘진(處士 全州 李震春)'으로 새겨져 있다. '후손 6대손 기조(起助-기봉(起鳳), 7대손 강식(康植), 1989년 정월'에 상석을 설치한 것으로 돼 있다.

▲'처사 전주 이진춘(處士 全州 李震春)'으로 새겨져 있다. 조실구-온양정씨 묘소 뒤에 밀장 흔적이다. 토질이 부드러운 와사토다.

▲조실구-온양정씨묘소 뒤 밀장한 흔적이다. 전주이씨인 '후손 6대손 기조(起助-기봉(起鳳), 7대손 (이)강식(康植), 1989년 정월'로 새겨져 있다.

▲한성판관 조실구-온양정씨 묘소 위쪽 25m 지점에 있는 바위다.

▲경상도 제일 부호 한성판관 조실구(曺實久, 1591~1658)-온양정씨(溫陽鄭氏, 1606~1681, 필선 정뇌경 누나) 묘소(합분) 위쪽 30m 지점에 있는 바위다.

▲군위현감-한성판관 조실구(曺實久, 1591~1658)-온양정씨 묘소에서 바라 본 갈평리 전경이다.

▲붉은 점이 갈평2리 경로당에서 바라본 조실구-온양정씨 묘소다.

▲붉은 점이 조실구-온양정씨 묘소다. 갈평리 산 18번지에 있다. 갈평2리 경로당에서 포장된 좁은 농로를 따라 간 후, 파킹하고 밭으로 50m 걸은 후 산능선 40m를 올라가면 묘소가 있다. 경로당에서 1.3km 거리다.

좌측 붉은 점은 갈정승(葛政丞) 사당이다. 조실구 묘소에서 직선 거리로 2.6km 떨어져 있다. 경상도 제일 부자였던 '조실구'가 '갈정승'이 아닐까. 묘소와 일직선상에 사당(祠堂)이 있는 게 더욱 기묘하다.

▲문경읍 갈평리(구 신북면) 갈정승(葛政丞) 사당이다. 갈평2리 경로당에서 1.4km 떨어져 있다. 갈정승(葛政丞)이 '한성판관 조실구(曺實久)'가 아닐까.

▲洞神葛丞相之位(동신갈승상지위)다.

▲문경읍 갈평리 갈정승(葛政丞) 사당이다.

▲갈정승(葛政丞) 사당이다.
訓大夫行漢城府判官曹公墓碣銘幷序 丙午公姓曹。諱實久。字子誠。昌寧世家也。始祖諱謙。尙麗祖公主。官至太樂丞。高祖諱彥博。文科戶曹佐郞。 贈副提學。曾祖諱夢禎。 贈領議政。祖諱倬。刑曹參判。 贈領議政。能文章狀元及第。歷敭華貫。晩節謙退守靜。書史自娛。著二養編三卷行於世。考諱明勖。文科階通政。利川府使。 贈左議政。妣原州元氏。兵使俊良之孫。縣監埏之女也。公生於萬曆辛卯八月十三日。中乙卯進士。屢擧不第。官至軍威縣監漢城府判官。以戊戌七月初四日終。享年六十八。初娶文化柳氏希奮之女。再娶溫陽鄭氏生員諱晥之女。俱無子女。以族弟佐郞時逸子夏長爲後。公擧進士未久。補東宮洗馬。遷副率。旋棄官。蓋自癸丑以後廢母之論方興。館學紛紜。其仕也。只欲避館學也。中年流寓慶尙道安東之豐山者二十餘年。絶迹交遊。無意仕宦。晩歲專城之任。府僚之職。亦倘來也。參判公葬地有石患。自府使公生存時欲移葬。數十年經營而未就。公求得吉地於安東寓所十里許地宗山之下萬雲洞。移厝參判公之墓。葬府使公於其南邊之原。立碑以表之。公沒之年九月。夏長奉公柩葬于安東先塋之下。公之志也。夏長有一男幼。公沒之三年。夏長死。其子繼死。鄭氏更以公族弟士人時重子夏疇爲公後。嗚呼。某交公晩而知公審。見公稀而慕公深。昏朝時李爾瞻爲廣昌府院君。柳希奮爲文昌府院君。朴承宗爲密昌府院君。爾瞻專執國柄。柳,朴之勢焰雖不如爾瞻。亦幾間簉。故世號三昌。三昌之子弟親戚無不爲高科顯爵。而公以柳之贅。終不決科。亦不仕進。公之爲人。於斯可知也。子思子以辭爵祿之難。班於蹈白刃。古猶然矣。況末路乎。人知有科第爵祿。而不復知有仁義。莫不馳騖飛揚於名場利窟。父詔其子。兄勉其弟。朋友相招。思其力之所不及。行險而僥倖者擧世滔滔。力所及勢所易而自不爲者。我公之外有幾人。非有所得於胸中。而能然乎。某之所取於公者。此一也。子思子曰。君子之道。造端乎夫婦。詩云。刑于寡妻。至于兄弟。以御于家邦。大學之道。以齊家爲治國之本。人之觀人。亦當以此也。是以。詩人欲彰文王之德。則不言文王之德而只言后妃之德。欲彰南國諸侯被文王之化。則不言諸侯之德而只言夫人之德。古人之見識如此矣。某聞公之內閤鄭氏。事姑聽而婉。事夫子柔而正。待夫家庶弟庶嫂禮而誠。家內戚疏膳服各適其宜。家政細事則不敢以關公。而亦無毫末不使公知者。婦德可謂盛矣。而妻道無成。則此豈不本於公也。某之所取於公者。此二也。推此二事。可知百行。其他則不必錄也。況進士鄭維岳撰其行狀。鄭。學者也。必不阿其所好而苟言之。某何可煩複而遣辭也。銘曰。公不見知。蓋公自守。公不見用。豈公不偶。命也無息。數也不壽。式穀有似。天不公負。無不或承。天所啓佑。
(1728년 무신혁명 대장군 휘 聖佐 8세손 曺濽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