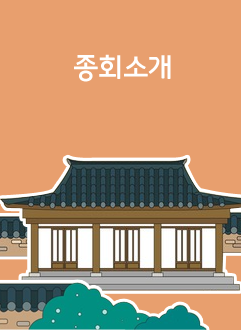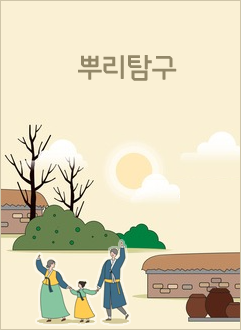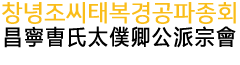통훈대부 행 대구도호부사 조공 묘갈명: 동계 정온 지음.
페이지 정보
孤竹先生 작성일24-06-05 08:09 조회13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635년(인조13) 1월 전 이조참판 동계 정온 지음. 나 찬용의 12대 조부임.
천계(天啓) 4년(1624, 인조2) 12월 갑자일(14일)에 통훈대부(通訓大夫) 대구도호부사(大丘都護府使) 조공(曺公, 주: 조응인)이 병으로 집(주: 합천군 묘산면 안성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고, 10년 뒤에 배위(配位) 숙인(淑人) 이씨도 세상을 떠나니, 그 아들 정립(挺立)이 상복을 입은 채 찾아와서 팔계(八溪, 주: 초계)의 정온(鄭蘊)에게 묘갈명을 청했다. 온(蘊)은 다행히 부자간에 교분을 맺은 처지라 감히 사양하지 못한다.
공의 휘는 응인(應仁)이고, 자는 선백(善伯), 호는 도촌(陶村)이며, 선조는 창녕인(昌寧人)이다. 신라 때로부터 멀리 대서(代序)가 있었고, 고려에 들어와서 휘 겸(謙)이란 분이 있었으니, 태조의 따님 덕궁공주(德宮公主)에게 장가들었다. 이분이 비조(鼻祖)가 된다. 그 뒤로 연이어 평장사(平章事)에 제수된 것이 8세(世)나 됐다.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더욱 번창하여 대대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다. 휘 계형(繼衡)은 벼슬이 호조참판이니, 곧 공의 증조부이다. 이분이 휘 언홍(彦弘)을 낳으니 교위(校尉, 주: 정6품)이고, 이분이 휘 몽길(夢吉)을 낳으니 증(贈)승지(承旨)이다. 승지가 평산신씨(平山申氏)에게 장가들었으니, 곧 고려의 장절공(壯節公) 숭겸(崇謙)의 후손이고 고(故) 징사(徵士) 송계(松溪) 선생 휘 계성(季誠)의 따님(1522~1580)이다. 송계는 남명 조식(南冥 曺植) 선생, 황강 이희안(黃江 李希顔) 선생과 도의의 사귐을 맺어 세상에서 영중삼고(嶺中三高)라 일컬었다. 가정(嘉靖) 병진년(1556, 명종11) 5월 16일에 합천의 심묘촌(心妙村)에서 공(公, 주: 조응인)을 낳았다.
공은 7, 8세 때에 기운과 도량이 이미 완성됐다. 승지(承旨, 주: 몽길)공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아직 어린 나이였으나 그 슬퍼하는 모습과 애달프게 부르짖는 것이 어린아이로서 행할 수 있는 바가 아니어서 조문하는 사람들이 남다르게 여겼다. 뒤에 모부인의 상을 당해서는 시묘(侍墓)하면서 상을 마쳤고, 장례와 제사를 모두 예법에 맞게 하니 사우(士友)들이 칭찬했다.
처음에 자형 김공 담수(金公 聃壽)에게 배웠고, 이어 한강(寒岡) 정선생(鄭先生,주: 정구)을 배알했다(주: 도촌 스승인 영의정 내암 정인홍은 의도적으로 뺐음). 선생이 한 번 보고 그가 훌륭한 선비임을 알아 대학장구(大學章句)를 가르쳤고, 학업을 마친 뒤에 돌아왔다. 그와 함께 교유한 사람은 모두 당시의 명사들이어서 이로 말미암아 학문이 더욱 밝아지고 문장이 더욱 진보하였다. 특히 사학(史學)에 뛰어나서 고금의 치란(治亂)과 인물의 출처에 대해 눈앞의 일처럼 분명히 알았다. 남는 힘으로 과거 공부를 일삼아 여러 번 향시에 합격했으나 끝내 대과(大科)에 뜻을 얻지 못하자, 마침내 종적을 거두고 다시 응시하지 않았다.
중년에는 자매와 친인척의 자식 중에 부모를 잃어 배우지 못한 자가 있으면 거두어서 가르쳤고, 가난하여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혼수를 도와주었고, 내외친으로 친소(親疏)를 막론하고 난리로 인해 떠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모두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온전히 살아가게 된 자가 매우 많았다.
기해년(1599, 선조32)에 처음 상의원 별제(尙衣院 別提)에 제수됐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정미년(1607)에 또 왕자사부(王子師傅)에 제수되자 드디어 직책에 나아가서 3명의 왕자를 가르쳤고, 선묘(宣廟, 주: 선조)가 승하하자 벼슬을 그만두고 돌아왔다. 또 3년 뒤에 와서 별제(瓦署 別提: 기와·벽돌 담당 관서 종6품)에 제수됐고, 임기가 찬 뒤에는 공조좌랑(工曹佐郞)으로 승진했다. 얼마 뒤에 사복시 주부(司僕寺 主簿)로 옮겼고, 겨우 한 달 만에 산음현감(山陰縣監)으로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일로 인해 관직을 떠났다. 임자년(1612, 광해4)에 또 용담현령(龍潭縣令)으로 나갔는데, 공무를 봉행하고 백성을 다스림에 한결같이 정성과 신의로써 하여, 재임 4년 동안 치적(治績)이 항상 최고가 됐다.
을묘년(1615)에 온양군수(溫陽郡守)로 승진돼서도 용담현을 다스릴 때와 같이 했으나 엄격함은 더했다. 당시 여러 궁가(宮家)가 민전(民田)을 빼앗는 폐단이 나라 안에 만연했다. 동궁인(東宮人)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수백 명의 무리를 이루어 온양 경내에 들어와서 민전을 빼앗고 점거한 것이 매우 넓었다. 공이 이에 그들을 잡아 묶어 두고 이어 급히 궁료(宮僚: 동궁 소속 관료)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 신민(臣民)들이 동궁의 어진 명성을 들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사인(私人)을 놓아 민전을 빼앗고 있으니, 제공(諸公)들은 보도(輔導: 잘 도와서 인도함)하는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이를 구제할 수 없습니까" 했다. 궁료들이 곧 서연(書筵)에 글을 올리자, 즉시 명령을 내려 그 사람을 벌하고 민전을 돌려주게 했으니, 온양 백성들이 그 해를 면할 수 있었다.
처음 온양 풍속에 교생(校生)과 외사(外士)의 구별이 있었다. 성묘(聖廟)를 지키고 제기(祭器)를 관리하는 자는 모두 농부의 자제로 외사라 이름했는데, 노비로 간주하여 일찍이 교문(校門)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다. 공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무슨 폐습(弊習)이란 말인가. 내가 반드시 계도할 것이다" 하고, 봄과 가을의 석채례(釋菜禮) 때에 반드시 직접 제사의 일을 맡아보면서 태만하지 않고 더욱 경건하게 하니, 제생(諸生)들이 모두 달려 나와서 묵은 폐단이 크게 바뀌었다. 이로 말미암아 또 지위를 높여 대구부사(大丘府使)에 제수됐다.
대구부는 경상감영(慶尙監營) 아래에 있어 책응(責應: 책임지고 물품을 줌)할 일이 많고 호령이 몹시 번거롭고 바쁘지만 공은 넉넉하고 한가롭게 처리하여 폐단을 혁파하고 잔민(殘民: 피폐한 백성)을 소생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얼마 뒤에 마침 정조(鄭造)가 경상감사로 부임했다. 공은 즉시 떠날 뜻을 두었으나 벌써 그의 공격을 받았으니, 곧 그가 사건을 무계(誣啓)함으로써 왕옥(王獄)에 반년 동안 갇혀 있다가 마침내 억울한 실상이 밝혀져서 풀려났다. 이후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내며 더욱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았고, 마침내 이렇게 여생을 마쳤으니, 향년 69세였다.
공의 사람됨을 말하자면,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기운과 모습이 맑고 온화했다. 남의 선행을 말하기를 즐거워하여 마치 자기가 선행을 한 것처럼 여겼고, 자신을 단속하고 외물을 접할 때에는 힘써 충후(忠厚)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남과 더불어 말할 때에는 즐겁게 어울려 불가한 바가 없을 듯하지만 그 잘못됨을 보게 되면 준엄한 말로 책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했다.
정인홍(鄭仁弘)의 행사(行事)가 바르지 못함을 보고서는 온갖 방도로 바로잡고 구원하여 허물이 없는 곳으로 들여놓으려 했고, 이이첨(李爾瞻)의 간사함을 먼저 알고서는 마땅히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끝내 그를 감동시켜 경청하게 하지 못했다. 그(주: 정인홍)가 말년에 이르러 국가의 윤기(倫紀)의 변괴(주: 1614년 2월 영창대군 죽임)를 만나 큰 낭패를 겪게 될 상황이 되자, 공은 드디어 자취를 거두고 물러나며 편지를 보내어 절교했다. 그러나 그가 체포돼 죽임을 당하게 되자, 공이 조곡(弔哭)하고 부의(賻儀)도 전하여 평생의 의리를 폐하지 않았으니, 공(公)이 간직한 마음을 더욱 알 수 있는 것이다.
※[주: 1614년(광해6) 2월 영창대군 이의(9세)가 죽임을 당하고, 1617년(광해9) 12월 인목대비가 서궁에 유폐됐다. 그런데 1618년(광해10) 12월 말 새해를 앞두고 대구도호부사 조응인이 광해가 영의정 정인홍에게 하사한 음식물을 들고 가야면에 있는 스승 정인홍을 방문했다. 이를 보면, 위 묘갈명에 "그가 말년에 이르러 국가의 윤기(倫紀)의 변괴를 만나 큰 낭패를 겪게 될 상황이 되자, 공은 드디어 자취를 거두고 물러나며 편지를 보내어 절교했다"는 것은 조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정인홍'을 비방한 것은 아들 조정립 요청 또는 동계 정온(桐溪 鄭蘊)이 스스로 총대를 맸을 것이다. 당시 조정립은 1623년 계해정변 후 파직돼 고향 묘산 안성리에 방귀전리돼 있었지만, 복권될 기미가 무르익고 있었고, 이 조응인 묘갈을 세우고 2년쯤 지나 1637년(인조15) 2월 조응인 장자 조정립은 정5품 공조정랑으로 복권된다.
정온이 1627년 이흘(李屹) 묘갈명을, 1639년 이대기 묘갈명을 지을 때는 '정인홍'을 전혀 비방하지 않았다. 특히 이대기는 4년 동안 백령도에서 귀양살이를 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내암이 쓴 남명집(1604년 간행) 발문에 대해 조응인은 내암 제자들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606년(선조39) 성균관 전적(典籍, 정6품) 조우인(曺友仁)이 사촌 형 조응인(曺應仁, 별좌)에게 보낸 '상종형조선백(上從兄曺善伯)'이라는 편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편지가 후대(1750년 경)에 조우인 후손들이 왜곡한 것이리라.
"형님과 내암의 관계는 (단지) 내암과 남명만의 관계가 아니라, 형님이 곁에서 따르며 개도(開導)해 줘 후학들에게 비난의 의론을 면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그 말(주: 퇴계를 비판한 내암의 남명집 발문)을 뭉개고[而至於彌縫其說] 애써 드러난 논의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곧 분분한 말들이 생길 것이다. 후학들에게 논쟁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형님이 깊이 생각해서 잘 대처해 달라." [이재집(1750년경 간행) 권2 상종형조선백(上從兄曺善伯)]
그런데 1612년 9월부터 1619년(광해11) 3월까지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직책을 가지고 있던 내암 정인홍을 "비난하며 절교했다"고? 이 편지를 조우인이 사촌형 조응인에게 보내고 10년 뒤, 찰방 조우인은 영창대군(3세)을 옹립하려고 했던 영의정 유영경(柳永慶) 등 소북파(小北派)를 1608년(선조41) 1월 제거하여 광해를 임금으로 옹립하는데 공을 세워 1614년(광해6) 10월에 정운원종공신(定運原從功臣, 841명) 1등(253명)에 녹훈됐다. 이를 보면 계해정변(1623년)과 1728년(영조4) 무신혁명 실패 후 상주 사벌 및 예천 개포의 조우인 후손들이 이재집을 왜곡한 게 확실하다.
공은 전의이씨(全義李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이씨는 고려의 태사(太師) 휘 도(棹)의 후손이다. 증조 휘 창윤(昌胤)은 장령(掌令)이고, 조부 휘 공보(公輔,주: 1497~1579, 사촌 동생: 남명 자형 이공량, 동서: 문익성<문홍도 작은 할배>)는 현감(縣監)이고, 고(考) 휘 득분(得蕡, 주: 이대기 부친)은 군자감 정(軍資監 正)이다. 군자감 정은 강양이씨(江陽李氏)에게 장가들었으니, 절도사 윤검(允儉)의 손녀이고, 판관 희안(希顔, 주: 1504~1559, 고령현감, 묘갈명을 친구 남명이 지음)의 따님이다. 희안은 이른바 황강 선생(黃江 先生)이라는 분이다.
숙인(淑人, 주: 전의이씨)은 법도 있는 가문에서 생장하여 덕과 행실이 맑고 아름다웠다. 시어머니를 받드는 데 효성스러웠고 남편을 섬기는 데 유순했다. 다섯 형제가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자 선영에 묘갈이 없음을 평생의 한으로 여기더니, 석공을 모집하여 비석을 세우면서 비용은 모두 자신이 담당했다. 기일(忌日)과 절사(節祀)를 만날 때마다 제물을 갖추어 임시로 제사를 지냈는데, 해마다 이를 상례(常例)로 삼았다. 숭정(崇禎) 계유년(1633, 인조11) 9월 6일에 세상을 떠났으니, 태어난 지 77년째 되던 해였다. 오도산(吾道山) 동쪽 기슭 유좌 묘향(酉坐 卯向, 주: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한 좌향(坐向))의 등성이에 안장했으니, 공과 묘역은 같으나 무덤은 다르다(주: 상하분).
공은 3남 2녀를 두었다. 장남 정립(挺立)은 벼슬이 장령(掌令)이고, 다음 정생(挺生)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정언(正言)이고, 다음 정영(挺英)은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선전관(宣傳官)이다. 장녀는 감찰(監察, 주: 사헌부 정6품) 윤시남(尹時男)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사인(士人) 윤정벽(尹正辟)에게 시집갔다. 정립은 자녀 10명을 두었다. 장남 시량(時亮)은 생원(生員)이고, 차남은 시윤(時胤)이다. (장자 조정립) 장녀는 시집가서 선전관 이민발(李敏發, 주: 1599~1670, 여흥부사, 형조판서 이명 아들, 묘소: 양주군 아차산)의 처(妻, 주: 창녕조씨 1600~1663, 묘소: 조부 조응인 묘소 인근, 창녕조씨-이민발 사이에 자식이 없음)가 됐고, 다음은 시집가서 사인(士人) 이전(李瑑, 주: 1607~1668, 하빈현 기곡마을 출생, 호조좌랑 이지영 장자)의 처가 됐고, 그 다음은 모두 어리다. (조응인 차남) 정생은 자녀 7명을 두었다. 장남 시일(時逸)은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좌랑(佐郞)이고, 다음 시원(時遠)과 시달(時達, 주: 시수·時遂의 오기. 時遂가 맞음)은 모두 어리다. (조정생) 장녀는 (삼척부사 권준·權濬 장남인) 사인 권극리(權克履)에게 시집갔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정영은 일찍 죽어 후사가 없고(주: 1960년 고령 다산면 송곡리에서 투탁으로 입적했으나, 假孫으로 판명돼 2023년 7월 퇴출됨), 윤시남도 후사가 없다. 윤정벽은 자녀 4명을 두었다. 장남은 희(喜)이고, 차남은 지(志)이다. 딸은 (권극리 사촌동생인) 사인 권극이(權克頤, 주: 權克恒의 오류임. 삼척부사 권준 막내아들 권극항·權克恒임. 즉 윤정벽은 권도<권준 사촌형>와 겹사돈임)에게 시집갔고, 다음은 어리다. 내외손 및 증손 남녀가 모두 30명이다.
아, 공은 세족의 뒤를 계승했고, 또 자신의 몸에 선행을 쌓았다. 공이 살아 있을 때 자손이 이미 현달한 이가 많았고, 또 자손이 이처럼 많았으니, 필시 발복(發福)함이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이에 명(銘)을 짓는다.
생각건대 공의 계통은 (惟公之系)/멀리 신라에서 시작되었네 (遠自羅世)/고려 때에 더욱 성대하여 (入麗尤大)/구대에 걸쳐 평장사를 역임했고 (九代平章)/우리 조정에 들어와서는 (至我國朝)/그 명성 더욱 창대하였네 (厥聲彌昌)/남쪽으로 옮겨 온 것은 (其遷于南)/공의 황고 때부터이고 (自公皇考)/대대로 쌓아 온 공덕은 (世德之蓄)/공이 그 보응을 받았네 (公應其報)/공은 날 때부터 남달라 (公生而異)/어려서 친상을 슬퍼했고 (幼能哀喪)/일찍이 스승과 벗을 따라 (早從師友)/시례를 강론하는 곳에 노닐었네 (詩禮之場)/묘께서 가상히 여기시어 (宣廟嘉乃)/세 왕자의 스승을 삼으니 (俾傅三子)/가르침에 방도가 있었고 (開迪有方)/사심 없이 일을 처리했네 (屛挾處事)/내직으로 낭서를 역임했고 (入翔郞署)/외직으로 군읍을 다스리니 (出宰郡邑)/임소에는 치적이 드러나 (在所治著)/송덕비가 우뚝이 섰다네 (頌石屹立)/험난한 시대를 만났으나 (遭時險巇)/홀로 위기를 벗어났기에 (獨脫危機)/장수를 누리리라 여겼더니 (謂享遐算)/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나 (胡至於斯)/오직 공의 자손들이 (惟其子孫)/많고 또 현달했으니 (旣衆且顯)/어질면 후손이 창성하는 이치 (仁後之理)/어긋나지 않음을 증명하였네 (可證非舛)/혹시라도 믿지 못하겠거든 (有如不信)/이 묘갈명을 상고할지어다 (考此銘撰)
명나라 숭정 8년 을해(1635, 인조13) 정월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경연지사 정온(鄭藴)이 짓고, 생원 이도(李蒤)가 쓰다.
*비문 글을 쓴 현와 이도(弦窩 李蒤, 1593~1668)는 설학 이대기(雪壑 李大期, 1551~1628, 함양군수, 조응인 손위 처남)의 사위인데, 고령 쌍림면 귀원 출생으로 창원 자여도(自如道) 찰방(察訪, 종6품) 및 직장(直長, 종7품)을 역임했다. 이도(李蒤)는 유학 전형(全榮, 조부: 전치원), 정선군수 조정융(曺挺融, 당숙: 조응인) 등과 교유했다.

▲통훈대부 행 대구도호부사 조공지묘, 숙인 전의이씨지묘다. 대구도호부사 도촌 조응인 묘소: 합천군 묘산면 산제리 가야마을 산100-1번지에 있다. 1635년(인조13) 봄에 건립한 아래 가운데 있는 도촌 묘비석의 글은 이조참판 동계 정온이 지었고, 글은 생원 현와 이도(弦窩 李蒤)가 썼다. 도촌 조응인(陶村 曺應仁, 1556~1624)은 영의정 내암 정인홍(來庵 鄭仁弘, 1536~1623.4)의 제자다.

▲도촌 조응인 손자 며느리 강양이씨(조시매·曺時邁<1627~1688> 배위, 김봉리에 살다가 1986년 합천댐 수몰로 묘산면 도옥리로 이주한 조영렬 웃대 조모) 묘소 밑에서 바라 본 전경이다.
*블로그 '대구도호부사 도촌 조응인 연보' 참조: https://blog.naver.com/antlsguraud/220901104331
*블로그 '정주목사 오계 조정립 묘갈명' 참조: https://blog.naver.com/antlsguraud/221322273159
通訓大夫 行 大丘都護府使 曺公 墓碣銘-幷序
天啓四年十二月甲子。通訓大夫, 大丘都護府使曺公。以疾終于家。後十年。其配淑人李氏。亦歿。其孤挺立累然服喪。來問銘於八溪鄭蘊。蘊幸得交父子間。不敢辭。公諱應仁。字善伯。號陶村。其先昌寧人。自新羅遠有代序。入高麗有諱謙。尙太祖女德宮公主。寔爲鼻祖。厥後聯拜平章者八世。至我 朝益蕃昌。代有聞人。有諱繼衡。官戶曹參判。是公之曾祖。是生諱彥弘。校尉。是生諱夢吉。 贈承旨。承旨娶平山申氏。卽高麗壯節公崇謙之後。故徵士松溪先生諱季誠之女。松溪與南冥曺先生植,黃江李先生希顏。爲道義交。世謂嶺中三高。以嘉靖丙辰五月十六日。生公于陜川之心妙村。年在齠齕。氣度已成。承旨公卽世。尙幼也。其戚容哀號。有非童子所能者。弔者異之。後丁母夫人憂。廬墓終喪。葬祭皆以禮。士友稱之。始從姊壻金公聃壽學。仍得謁寒岡鄭先生。先生一見知其爲善士。授大學章句。卒業而歸。其所與交。皆一時名流。由是學益明文益進。尤長於史學。其於古今治亂人物出處。了了如眼前事。以餘力事擧子業。累捷發解。竟屈南宮。遂收蹤不復應。中身也。娣妹宗姻之子有孤而失學者。收敎之。有貧不能媾者。助之資。內外親無疏近。因亂流漂者。皆家歸之。全活甚多焉。己亥。初授尙衣院別提。不赴。丁未。又拜 王子師傅。遂就職。敎三 王子。 宣廟賓天。解歸。且三年。旋拜瓦署別提。后滿。陞拜工曹佐郞。俄移司僕寺主簿。僅閱月。出守山陰縣。未幾。以事去官。壬子。又起令龍潭縣。奉公臨民。一以誠信。居四載。治常爲最。乙卯。陞拜溫陽郡守。治之如龍縣之爲。而介厲加焉。時諸宮家奪民田之弊遍國中。有稱東宮人者。群數百入其境。攘占甚廣。公乃捕繫之。仍馳書與宮僚曰。我臣民戴 東宮仁聞久矣。今也縱私人奪民田。諸公職輔導其不能救歟。宮僚乃進書于 書筵。卽下令辜其人。還其田。溫民得免其害。始溫俗。有校生,外士之別。守聖廟執籩豆者。皆耒耟之子名外士者。皆奴視之。足跡未嘗入校門。公慨然曰。是何等弊習也。吾必有以導之。每當春秋釋菜。必躬親行之。不懈益虔。諸生駿奔。宿弊丕變。由是又進律拜大丘府使。府在營下。責應多門。號令煩劇。公處之優閑。革弊蘇殘。非一二數。居無何。適會鄭造按道。公卽有去志。而已被其齮齕。乃以事誣啓。拘 王獄半年。事得解。自此歸臥田廬。益無意於世。卒以此終。年六十有九。公爲人性行純美氣貌淸和。樂道人之善。如自己出。行己接物。務以忠厚爲心。與人語。怡怡若無所不可。而至見其非誤。則峻辭以責之。故人皆畏而愛之。見其鄭仁弘行事不正。萬端矯捄。欲納無過之地。先知爾瞻之奸。言其當絶。而終不能動其聽。迨其末年。遭國家倫紀之變。做得大狼狽。公遂斂跡而退。投書而絶。然其被逮受戮也。公爲之哭賻。不廢平生之義。公之所存。益可見矣。公娶全義李氏。高麗太師諱棹之後也。曾祖諱昌胤。掌令。祖諱公輔。縣監。考諱得蕡。軍資監正。監正娶江陽李氏。節度使允儉之孫。判官希顏之女。是所謂黃江先生者也。淑人生長法門。德行淑嘉。奉姑孝。事夫順有倫。五人俱先歿。以先隧無碣。爲平生恨。募工豎石。費皆出已。每當忌辰節祀。備物別奠。歲以爲常。歿於崇禎癸酉九月六日。距生之年七十七歲。葬于吾道山東麓酉坐卯向之原。與公同兆而異域。公有子男三人。女二人。長曰挺立。掌令。次曰挺生。文科正言。次曰挺英。武科宣傳官。女長適監察尹時男。次適士人尹正辟。挺立有子女十人。長曰時亮。生員。次曰時胤。長女嫁爲宣傳官李敏發妻。次嫁爲士人李璥妻。其次幼。挺生有子女七人。長曰時逸。文科佐郞。次曰時遠, 時達(주: 時遂의 오기)。皆幼。長女適士人權克履(주: 權克恒의 오기)。餘皆幼。挺英早死無嗣。尹時男亦無后。尹正辟有子女四人。長曰喜。次曰志。女適士人權克頤。次幼。內外孫若曾男女凡三十人。嗚呼。公承世族之後。又積善于躬。及公之存。子孫多已顯。且其衆多如此。蓋必發其在於斯乎。是爲之銘。銘曰。惟公之系。遠自羅世。入麗尤大。九代平章。至我 國朝。厥聲彌昌。其遷于南。自公皇考。世德之蓄。公應其報。公生而異。幼能哀喪。早從師友。詩禮之場。 宣廟嘉乃。俾傅三子。開迪有方。屛挾處事。入翔郞署。出宰郡邑。在所治著。頌石屹立。遭時險巇。獨脫危機。謂享遐算。胡至於斯。惟其子孫。旣衆且顯。仁後之理。可證非舛。有如不信。考此銘撰。皇明崇禎八年乙亥正月嘉善大夫行吏曹參判兼同知經筵事鄭藴撰。生員李蒤書
(1728년 무신혁명 대장군 휘 聖佐 8세손 曺濽溶)